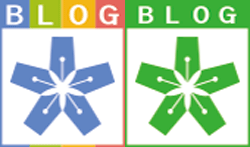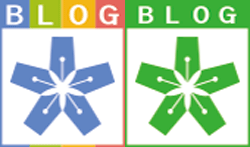오늘은 노인복지관에 글짓기교실 봉사하러 가는 날이다.
지난주에 약속했던 교재를 만드느라 아침부터 서둘렀다. 강의가 오전 11시에 시작되기에 10시 30분까지는 끝내야 된다.
작성한 문서를 저장한 후 인쇄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프린터기가 움직일 생각을 않고 있다. 살펴보니 전원 수위치가 꺼져있어서 눌러 켰다. 그래도 묵묵부답이다. 이번에는 스위치를 껐다 켜고 화면을 살폈다. ‘검정 잉크 부족’이란 신호가 떴다.
이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며 단골 컴퓨터 서비스 가게로 전화 했다. 프린터 기종을 불러 주었더니, 다행으로 마침 맞는 잉크가 있다고 했다. 걸어서 10분 거리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잉크를 바꿔 끼고 확인 인쇄를 시켰다. 작동 대신 이번에는 노란색 잉크가 보족하다는 신호가 뜨잖은가? 노랑은 전혀 생각 밖이었다.
“지금 주문해도 내일에나 도착해요.”
서비스 가게 주인이 자기에게 큰 잘못한 일이라도 있다는 듯 미안해했다.
“프린터기 포장을 뜯고 나서 칼라 인쇄는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요즈음 프린터기는 출고할 때 장착된 카트리지에 잉크를 조금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얄밉게 얄팍한 상술이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일로 기억된다.
저녁식사 후 숙제를 하다가 깜박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30촉(30w)짜리 희미한 전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빨아 말린 양말 중 구멍 난 짝을 찾아 못쓰게 된 백열전구를 넣어 깁고 계셨다. 어머니 바느질 덕에 숙제를 마저 할 수 있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60년대 중후반. 참전용사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귀국박스’라는 보너스 제도를 제공받았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목숨 걸고 전투임무 수행한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약간의 물질적 보상 제도였다.
직접 전투만 한 병사는 부대 밖에 외출할 기회가 거의 없어 귀국박스에 담을 물건을 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장에 흩어진 탄피를 모으거나, 전투식량(C-레이션) 주머니에 들어있던 일회용 커피봉지로 채우기도 했다. 첨가물이 안든 커피는 한국 병사들 관심 밖 물건이다. 더러는 라이터돌을 가져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흑백TV 보급이 퍼지고 있을 때였다. 어떤 기회에 일본 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적이 있었다. 전원만 꽂으면 금방이라도 화면이 나올법한 흑백TV가 쓰레기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는 한술 더 뜨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이걸 손에 넣으려고 밤새 대리점 앞에 줄을 서는 열성팬. 먼저 쓰던 물건이 아무리 멀쩡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떤 프린터기는 본체보다 카트리지 값이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약정기간까지만 견디도록 핸드폰을 만든다는 소문이 결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고 싶다.